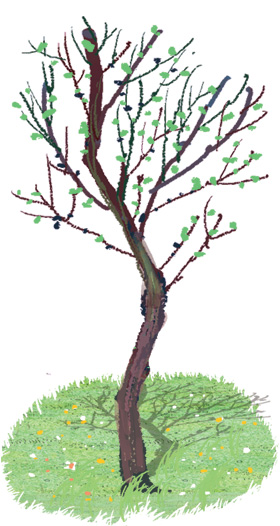
여릿여릿 피는 속잎이 청이 속눈물이라면
햇살은 공양미 삼백 석 지천으로 쏟아진다
옷고름 풀어 논 강물 열두 대문 열고 선 산
세월은 뺑덕어미라 날 속이고 달아나고
심봉사 지팡이 더듬듯 더듬더듬 봄이 또 온다
-정완영(1919~ )
감나무는 식구 같은 나무, 울 뒤에 두르고 같이 살았다. 그런 감나무 속잎이 피는 모습이 청이 속눈물이라니, 절묘한 비유에 탄복하며 감나무를 다시 본다. 다른 나무보다 잎이 조금 늦게 피어 그럴까. 아니면 기다림의 눈물이 배어 그런 것일까. 그도 아니면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공양을 하기 때문일까. 하긴 감을 두고 일찍이 '한국 천년의 시장끼여'라고 묘파(描破)한 시인이 아니시던가.
이제 꽃이 지면서 잎들이 꽃보다 곱게 다투어 피어날 것이다. 올봄은 꽃차례가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다 피어 꽃천지를 만들었는데, 새로 피어나는 잎들이 또 그렇게 산하를 뒤덮으며 푸르러질 것이다. 그런데도 노(老)시인의 봄은 너무 아프게 더디게 오나 보다. 그러면서, 봄이 이렇게도 오는가 싶어진다. 문득 더딘 봄볕을 쬐며 먼 데를 하염없이 바라볼 눈빛들이 스친다. 그래도 봄이 오긴 와서 햇살도 공양미 삼백 석으로 쏟아진다.
'가슴으로 읽는 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좋은 햇살/신현득 (0) | 2012.05.31 |
|---|---|
| 빈 자리가 필요하다/오규원 (0) | 2012.05.09 |
| 종소리/서정춘 (0) | 2012.05.09 |
| 서울은 복어국 먹는 계절 / 권상신 (0) | 2012.05.09 |
| 사월 비/이제하 (0) | 2012.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