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한당' 林巨正, 웃음과 신명에 엉덩이가 들썩인다
소설가 성석제의 내가 읽은 '임꺽정' - 義賊으로 가식·미화 안한 작가의 태도
전설·토박이 우리말이 샘물처럼 솟아… 손에 잡을때마다, 불로불사의 소설
 성석제 소설가
성석제 소설가

이십대 중반의 어느 겨울 아득하고 자족적인 한 경지를 이뤘다는 전설에 감싸인 어떤 선배가 사는 집에 들렀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갈아탈 버스를 잘못 알고 내렸고 그 바람에 차비가 모자라게 생겼는데 근처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그 선배밖에 없었으니 그리 갈 수밖에 없었다.
선배는 용건을 듣더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마도 부모에게 차비를 얻으러 간 모양이었다. 장발장처럼 무료해 하던 나는 거기까지 온 값을 할 게 없나 찾다가 십여 권쯤 돼 보이는 소설 한 질을 발견했다. 그래서 주섬주섬 책을 가방에 집어넣고 용을 써가며 주둥이를 오므리고 있는데 선배가 방에 들어왔다.
그는 경멸스러운 어조로 "그 책이 뭔 줄이나 알고 훔쳐 가려는 거냐?"고 물었다. 나는 냉큼 요즘 읽고 있는 게 미하일 숄로호프의 '고요한 돈 강'과 리처드 버튼의 '아라비안나이트'같은 권수 많은 걸 자랑하는 책이라고, 이 소설책이 짝이 될 만하겠다고 둘러댔다. 그러자 그는 귀찮은 걸 처치하는 걸 다행스러워하는 사람처럼 "그 소설 쓴 인간이 북한서 부수상인가 지냈다고 책 나오자마자 금서가 돼서 지하에서 복사본으로 돌고 있는 거다. 가다가 경찰한테 걸리거든 절대 내 이름 대지 마라. 나도 너를 모르는 놈이라고 할 거니까" 하고 가보라는 시늉을 했다.
◇춘원, 육당과 조선 3대 천재
경찰에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읽기도 전에 스릴과 호기심을 미리 맛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은 좀 특별했다. 저자의 이름은 벽초 홍명희. 나중에 알고 보니 내 고향과 그리 멀지 않은 충북 괴산이 고향이었고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과 함께 일제 때 조선의 3대 천재로 일컬어졌다고 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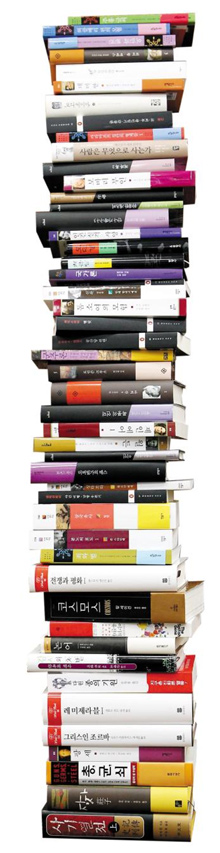
소설 제목은 '林巨正'인데 이름이 거정인지 꺽정인지 깍정인지 간에 한 권이 다 끝나가도록 주인공은 콧구멍도 보이지 않았다. 서두 '봉단편'은 임꺽정의 고모인 봉단이 주인공이고 갖바치 양주팔이 주역이 되는 '피장편(皮匠編)'에 이어 조정의 정쟁이 나오는 '양반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드디어 임꺽정이 나오는가 싶더니 일곱씩이나 되는 의형제들 이야기가 중편소설처럼 계속 끼어들어 주인공의 출연시간을 알뜰하게도 잘라먹는다.
임꺽정은 로빈 후드나 활빈당 같은 멋진 의적이 아니다. 그저 힘이 장사일 뿐 화적떼 두목으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멋대로 살아가는, 하늘이 내린 무식한 불한당에 이기주의자의 욕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기에 강도질은 기본, 마누라 포함 아무나 맘에 들지 않으면 욕설에 두들겨 패고 뼈마디 부러뜨리기는 다반사, 살인까지 예사다. 확률로 치면 만분의 일, 털끝 같은 한순간에(그러니까 9할9푼9리9모는 아니고)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웅다운 기상을 보여줄까 말까 하는데 그것조차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내게는 바로 이 '조명발'과 '분장발', 가식과 미화가 없는 작가의 태도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말하는 짐승'이라는 인간의 남루한 본질에 대한 가차없는 응시와 함께 인간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거룩한 그 무엇을 우리는 잘 알지조차 못한다는 것, 그에 대한 깨달음이야말로 현대성이고 문학의 본령이자 고전에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덕목이다.
◇어떤 나라 소설도 부럽지 않다
'林巨正'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는 접신한 것 같은 이야기의 신명이다. 읽는 사람 역시 흥이 나고 열이 올라 감성과 현존의 엉덩이가 같이 들썩거린다. 조선시대 중기 양반과 도둑, 백성의 일상이 극세화처럼 그려지고 어디서 들은 듯한 옛날이야기와 전설, 우리말, 토박이식 문장이 끊임없이 토출하는 샘물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웃겼다. 홍명희는 가장 엄숙하고 비극적이며 눈물 나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웃음기를 발견해내고야 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었다. 결국 고리타분한 옛날이야기 같으면서도 무슨 틀, 형식 같은 건 한걸음에 뛰어넘어 버리는 혁명적인 스타일에 우리말의 보물창고이기까지 한 엄청난 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 달 뒤 학교에서 만난 선배는 뭔가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약간의 친절함을 가지고 "그 소설 어땠냐?"고 물었다. 나는 처음에는 안 읽히더니 어느 순간 그 나름의 어법에 익숙해지니까 손에 침을 바를 새도 없이 책장이 넘어가더라고 대답했다. 90년대 해금이 되어 정식 출판된 '林巨正'을 다시 읽기도 하고 훗날 홍명희 '林巨正'의 미완성 부분을 손자인 홍석중이 덧붙여 완성했다는 판본을 읽기도 했다. 새로 읽을 때마다 어디서 시작하든 끝까지 읽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내게 '林巨正'은 손에 잡을 때마다 새롭게 되살아나고 되살아날 불로불사의 소설이다.
'林巨正'은 한 작가가 일평생 한 번 만져볼까 말까 한 거벽이다. 소설가 홍명희는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기회를 움켜잡았다는 점에서 행운아인 동시에 등불을 켜고 깨어 있던 자였다. 소설가의 후배에게는 그런 기회, 그런 거벽, 그런 선배 모두가 존재한다는 게 크나큰 자산이며 긍지의 원천인 동시에 부담이다. '林巨正'이 있는 한 우리 문학은 다른 나라의 어떤 소설이든 부러움으로 곁눈질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임꺽정' 독자 140자 트윗독후감]
"길 위의 사내들에게 믿을 건 제 몸과 서로의 의리뿐! 길 위에서 만난 그들은 몸으로 부딪히며 자기를 확인하고 서로를 알아간다. 토지와 핏줄이 아닌 새 세상을 향해 어깨를 걸고 가는 열린 사내들의 행로는 아프도록 통쾌하다" (아이디 minifeb)
'101파워클래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자 말씀'도 사실 인간적이고 평범하다 (0) | 2012.11.30 |
|---|---|
| 까라마조프씨네 형제들/이반의 대서사시에서 자유·구원 읽는다 (0) | 2012.11.26 |
| '파워클래식' 이래서 시작합니다/인생의 지혜 배우고 미래의 나침반 역할 (0) | 2012.11.26 |
| 당신의 삶을 비춰준 古典은? (0) | 2012.11.26 |
|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0) | 2012.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