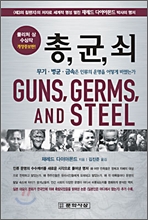이갑수 시인이 읽은 '총, 균, 쇠'
銃·菌·쇠를 다양성의 키워드로 역사·과학 결합해 알기쉽게 설명
산업국가가 수렵부족보다 발전? 당대엔 수렵이 가장 현대적인 것
 이갑수 시인·궁리출판 대표
이갑수 시인·궁리출판 대표

아주아주 오래전 인간의 기원이 시작되고 또 한참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가난뱅이 무명 화가 시절을 청산하기로 결심한 인간은 동굴 밖으로 뛰쳐나와 각 대륙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짐승을 가축화하고 식물을 작물화하면서 자연의 일부를 관리하고 통제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각 대륙에는 서로 다른 문명이 건설되었다.
1972년. 열대의 섬 뉴기니에서 새의 생태를 연구하던 저자(재레드 다이아몬드)는 한 토박이 흑인정치가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는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물건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세계의 지역적 불평등에 의문을 품었던 저자는 이 질문에 촉발되어 스스로 많은 질문을 만들면서 이 주제를 파고든다.
"왜 각 대륙의 문명의 발달 속도에 차이가 있는가." "왜 어떤 민족은 지배하고 어떤 민족은 지배당하는가." "왜 인류 사회는 서로 다른 운명을 지니게 되었는가."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듯 민족 간의 생리적인 차이가 다른 문명을 낳았다는 게 그간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하지만 저자에게 역사란 '지겨운 사실의 나열'이 결코 아니었다. 그는 그간의 역사가 외면했던 자연과학 분야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 원인을 밝혀나간다.
인류의 역사는 정복과 지배로 점철됐고, 그 결과가 각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그렇다면 어떤 원인으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을까. 왜 유럽이 다른 대륙의 원주민을 정복했을까. 역사에 과학을 결합시킨 저자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철의 등장은 식량의 생산성을 높였다. 이는 인구의 밀집을 초래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우월한 힘을 가능케 했다. 한편 유럽인들이 원주민을 제거하는 데에는 총의 역할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유럽은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병원균도 창궐했다. 이로 인한 전염병이 면역성이 전혀 없던 원주민들을 초토화시킨 것이다. '총, 균, 쇠'는 이처럼 인류 문명의 다양성을 지탱하는 여러 요인을 대표하고 함축하고 있는 열쇳말이다.
"왜 각 대륙의 문명의 발달 속도에 차이가 있는가." "왜 어떤 민족은 지배하고 어떤 민족은 지배당하는가." "왜 인류 사회는 서로 다른 운명을 지니게 되었는가."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듯 민족 간의 생리적인 차이가 다른 문명을 낳았다는 게 그간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하지만 저자에게 역사란 '지겨운 사실의 나열'이 결코 아니었다. 그는 그간의 역사가 외면했던 자연과학 분야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 원인을 밝혀나간다.
인류의 역사는 정복과 지배로 점철됐고, 그 결과가 각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그렇다면 어떤 원인으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을까. 왜 유럽이 다른 대륙의 원주민을 정복했을까. 역사에 과학을 결합시킨 저자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철의 등장은 식량의 생산성을 높였다. 이는 인구의 밀집을 초래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우월한 힘을 가능케 했다. 한편 유럽인들이 원주민을 제거하는 데에는 총의 역할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유럽은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병원균도 창궐했다. 이로 인한 전염병이 면역성이 전혀 없던 원주민들을 초토화시킨 것이다. '총, 균, 쇠'는 이처럼 인류 문명의 다양성을 지탱하는 여러 요인을 대표하고 함축하고 있는 열쇳말이다.
 일러스트=박상훈 기자 ps@chosun.com
일러스트=박상훈 기자 ps@chosun.com

저자는 환경 조건이 지난 1만3000년간 전 세계인의 역사에 미친 영향을 밝히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인류의 미래에 일어날 것인지를 알 수 있으리라고 했다. 어쩌면 문명이란 시간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퍼질러놓은 한 무더기의 똥일는지도 모른다. 공룡은 시시각각 사라지고 있다. 그 공룡의 행방을 안다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있을 것이다. 한때 인간은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면서 나아갈 길의 지도를 읽었다. 그러나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발밑의 그 무더기도 파헤쳐 보라고 저자는 권하는 것 같다.
몇해 전 고향 집안 할머니의 백수연에 참석했다. 한 생명이 몸을 받아 한 세기를 온전히 건사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첫돌상이야 누구나 받을 테지만 백돌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서울의 어느 예식홀에서 벌어진 잔치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었다. 왜 고향사람들은 한눈에 보아도 척 고향사람일까. 뜯어보면 얼굴도 성(姓)도 다 다르지만 풍기는 인상이나 행동거지가 왜 다들 비슷할까. 우리는 같은 물, 쌀, 햇빛을 먹고, 같은 사투리를 쓰면서 같은 들판과 골짜기에서 자랐다. 혹 그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일까. 저자의 흥미로운 설득력에 나의 오래된 의문 하나도 확 풀어졌다.
'101파워클래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체제·권력에 맞선 자유의지… 뻐꾸기는 날아올랐다 (0) | 2012.11.30 |
|---|---|
| '조르바' 읽고 사표 던졌다, 자유다… 후회? 두려움? 개나 물어가라지 (0) | 2012.11.30 |
| '공자 말씀'도 사실 인간적이고 평범하다 (0) | 2012.11.30 |
| 까라마조프씨네 형제들/이반의 대서사시에서 자유·구원 읽는다 (0) | 2012.11.26 |
| '불한당' 林巨正, 웃음과 신명에 엉덩이가 들썩인다 (0) | 2012.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