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해주러 간다
적신호로 바뀐 건널목을 허둥지둥 건너는 할머니
섰던 차량들 빵빵대며 지나가고
놀라 넘어진 할머니에게
성급한 하나가 목청껏 야단친다
나도 시방 중요한 일 땜에 급한 거여
주저앉은 채 당당한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뭔 중요한 일 있느냐는 더 큰 목청에
취직 못한 막내 눔 밥해주는 거
자슥 밥 먹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여?
구경꾼들 표정 엄숙해진다.
―유안진(19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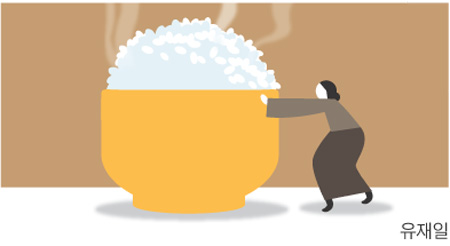
'가슴으로 읽는 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겨울 편지/김일연 (0) | 2012.12.23 |
|---|---|
| 木手와 小說家/김용범 (0) | 2012.12.23 |
| 김옥춘 선생님/임길택 (0) | 2012.12.23 |
| 길이 나를 들어올린다/손택수 (0) | 2012.12.23 |
| 나의 아나키스트여/박시교 (0) | 201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