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람들의 말이
나는 사람들의 말이 무섭다.
이것은 개라 하고 저것은 집이란다.
여기가 시작이고 저기가 끝이란다―
그들의 말은 너무도 분명하다.
사람의 감각도 무섭고, 조소어린 장난도 두렵다.
사람은 있을 일이며 있었던 일을 모조리 안다.
어느 산에 대한 경탄마저 이제는 없고,
정원과 장원이 신(神)과의 접경이 되고 있다.
나 언제나 경고하며 지키나니,
멀리 떨어져 살지어다.
내 즐겨 듣는 사물의 노랫소리.
허나 너희들이 손을 대면
사물은 굳어 입을 다문다.
내 주변의 온갖 사물을 죽이는 사람들이여.
―라이너 마리아 릴케(1875~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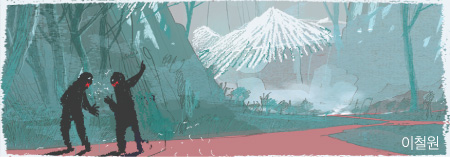
이 시는 인간이 가진 맹목성에 대하여, 사려 깊지 않음에 대하여 무서워하고 슬퍼한다. '시작'과 '끝'을 말할 수 있다니. 그것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니! '있었던 일'과 '일어날 일'을 다 안다니! 난센스다. 그러니 그 어떤 '경탄'마저 사라진 세상이 된 것이다.
함부로 사물에 손을 대서 사물의 입을 다물게 하지 말고 멀찍이 사물들이 입을 열고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는 사람, 과학자와 시인이 어디가 다르겠는가. 문득, 시심(詩心)이 없는 과학자도 노벨상을 받았을까 궁금해진다.
'가슴으로 읽는 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전히 남아 있는 야생의 습관/이병률 (0) | 2012.12.23 |
|---|---|
| 꼭 그만큼만/민현숙 (0) | 2012.12.23 |
| 겨울 편지/김일연 (0) | 2012.12.23 |
| 木手와 小說家/김용범 (0) | 2012.12.23 |
| 밥해주러 간다/유안진 (0) | 2012.12.23 |